5. IMS 열풍, FM음원의 전성기
이미 '1편 FM에서 MOD로'를 통해 IMS 플레이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확장자는 Iyagi Music Sound의 약자로 당시 '하늘소'라는 프로그램 팀이 만든 컴퓨터 통신 프로그램 이야기에서 이름을 따와서 만든 확장자 명입니다.
DOS 시절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은 '확장자'라는 개념을 잘 모르실 겁니다. 뭐 간단히 말하면 PDF 파일, MP3 파일 같이 여전히 사용되는 이것이 바로 확장자입니다.
90년대 학교에서도 사실상 컴퓨터 교육을 형식적으로 했기에 (애니악이 최초의 컴퓨터다라는 등등의 역사적인 부문만) 그야말로 컴퓨터 학원을 다니거나, 실전으로 부딪히며 배우던 시기.
일명 '옥소리'라는 국내에서 만든 AdLib 카드의 짝퉁업그레이드 버전으로 (PCM이 지원되었습니다), 일단 기존 애드립카드보다 저렴한 6,7만 원 대였기에 (애드립 카드가 10만 원 이상) 일단 대박을 터트렸죠.

당시 애드립카드의 작곡프로그램인 Composer로 음악을 만들면 확장자가 rol 파일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늘소'팀이 IMS라는 별도의 확장자로 변환시켜서 일명 그들이 만든 노래방 프로그램(ImsPlayer)에서 돌아가게 했던 것이죠.
IMS는 음악을 담고 있었으며 ISS는 가사파일이었습니다. 뭐 요즘으로 치면 동영상과 자막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에 하나 더, 애드립 카드로 작곡을 해 본 사람은 알지만 일반인은 모르는 음원 뱅크파일이 있었습니다. (확장자는 생각이 안 나네요)
즉 FM 변조를 통한 자기 나름의 악기를 모아둔 '사운드 폰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화된 폰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글자가 깨지는 것처럼, 적절한 사운드 뱅크를 불러오지 않으면 편곡자가 만든 오리지널 사운드를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 제너럴 한 뱅크를 활용했기 때문에,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음악을 즐기는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90년대 초반, 일본의 가라오케가 한국에 넘어오면서 생긴 노래방은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어갔습니다. (충무에도 제가 고등학교 시절 몇몇 군데가 영업을 개시)
동전을 넣고 노래를 부르던 방식이, 정액을 내고 시간제로 바뀌던 시기도 90년대 초중반이었습니다. 아무튼 '돈'이 들어가는 유흥을 컴퓨터로 공짜로 할 수 있게 한 것이 IMS 파일의 위대한 공유정신이었죠.


물론 그 파일은 컴퓨터 통신을 통해 구할 수 있었으며, 이른바 그 음악들을 만드는 사람들은 대도시의 문화 중심부에 있던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그 역시도 일반인들이 아닌 이른바 시대를 앞서가는, 소위 요즘 말로 얼리어덥터나 오타쿠 같은 부류에서였겠지만 말이죠.
이른바, 용산은 한국의 디지털 문화의 원천이었으며, 또한 집결지였죠. 그곳을 통해 아마도 많은 정보들이 오갔을 것이며, 같은 부류의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던 장소였을 겁니다.
지금의 용산은..... 하~... 역시, 박근혜 시절부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단어의 뜻이 많이 오용되고 더럽혀졌는데, 용산도 그러하군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휘리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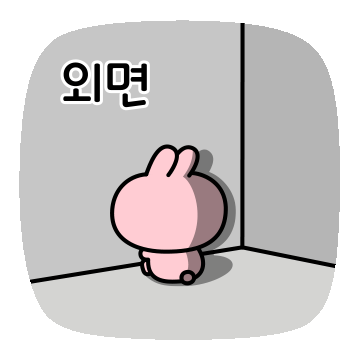
6. 컴퓨터 동아리에서 매일 노래를 부르다.
저는 대학 시절 컴퓨터 동아리에 가입했었는데, 초반에는 컬러 모니터에 놀랬고, 두 번째는 선배들의 미친 테트리스 실력에 놀랬으며, 세 번째는 주야장천 IMS 파일로 노래 불렀던 추억에 놀랬습니다.
당시 노래방에서 사용되던 기기의 사운드폰드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 IMS 파일로 보급되던 음악 파일은 결코 노래방의 사운드에 뒤지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노래방 기기는 드럼등이 PCM을 지원했어 훨씬 무게감이 있었겠으나)
컴퓨터 음악 전문 그룹은 MIDI란 것을 사용했죠. 미디는 특정 음악카드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디지털 음악의 입출력 표준 같은 것이었고(그것은 현재도 동일) 당시 별도의 사운드 폰트를 구매해야 했었는데, 대표적인 게 '롤렌드 사의 사운드 캔버스'

고가였던 (마치 카오디오처럼 생긴 ) 음원 장비를 연결하면 차원이 다른 음악을 들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저가의 사운드 카드에서도 사운드 캔버스 수준의 미디 음색이 구현되었으며, 이젠, 그냥 CPU에서 다 되죠. 그 이상도 지금은 가능한 상황.
전문적 영역이 아니면, 따로 사운드 카드가 필요하지 않은 시대인 21세기~!!.
아마도, 당시 노래방 기계는 미디를 기반으로 한 사운드캔버스 수준의 음원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잘 만든 IMS 파일은 음질에서는 밀리겠으나, 작곡자의 실력에 따라서 느낌적으로는 원곡에 더 가깝게 구현가능 했습니다. (기억하건대 그 시절의 노래방 곡들 중에는 원곡을 제대로 편곡하지 못한 것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통기타 치며 노래 부르던 대학시절을 상상했었는데, 시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승환의 '세상의 뿌려진 사랑만큼'은 너무 잘 만들어서 여럿이 같이 불렀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거기에, ISS 파일을 통한 가사도 출력이 되었고, 점점 노래방처럼 그래픽 영상까지 조촐하게 나오도록 프로그램은 진화를 했었습니다. 아마도 1993년을 관통하던 시절 컴퓨터를 가지고 계셨다면, 이 IMS 파일 한번 안 돌려보신 분이 없을 겁니다.
그야말로 공짜 노래방 같은 것이었으며, 컴퓨터 통신을 통해 구해진 파일들은, 지인들을 통해서 빠르게 복제되어 갔었죠.

다른 세상의 다른 마니아들이 만드는 음악, 그런데 만약 그런 사람을 주변에서 만난다면 어떨까요?
7. 충무에서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 친구가 자기 친구라며 소개를 해주는데, 얼굴을 보는 순간 국민학교 때 3학년 같은 반을 했던 동창이란 사실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그런 만남보다.. 그 친구가 만들었던 애드립 음악은 기존의 ims 음악을 능가하는 말 그대로 천잰데!!!.
더구나 그 친구는 음악을 전공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놀라움 밖에는 어떤 형용사도 떠오르지 않았죠. 그는 저한테 이건 C코드다 뭐다 설명을 하는데 제가 아는 거라곤 학창 시절 배운 으뜸화음 버금딸림화음 딸림화음 딱 3개뿐!.
암기 과목같이 지금도 떠오르는 도미솔, 도파라, 시레솔.(C코드, F코드, G코드)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문화의 변방에서 이 정도의 결과물을 뽑아내는 실력자의 존재자체가 신기방기했고, 그 이후 30년이 지나면서도 제 주변에 그 1/50의 일도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미묘하게 저에게 라이벌 의식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스크림 트래커를 가져다 카피해 주었는데, composer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직관적이었습니다. 당시 음악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지만, 드럼 비트 정도는 2시간 정도면 만들 수 있을 만큼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프로그램을 처음 접한 지 1,2주가 지났을 때, 바로 그 천재 친구가 스크림 트랙터로 그럴싸한 음악을 벌써 만들어서 들려주었던 것이죠. 여기서 재밌는 점은 제가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망치를 잘 다룬다고 좋은 건축가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잘 다룬다 -> 좋은 결과를 만든다. => 여기까지는 제법 논리적으로 부합합니다. 그렇죠?
근데, 워드프로세서를 잘 다룬다 -> 좋은 소설을 쓴다 => 이건 뭔가 좀 잘못된 부문이죠. 그런데 그 당시 제가 그런 생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컴포져는 오래된 프로그램이었고, 매뉴얼도 없어서 (영어도 잘 못하고, 음악 지식도 없고) 애진작에 포기했지만, 스크림 트래커는 따끈따끈한 신제품. 그런데 그걸로 누군가 음악을 만든다면, 나라고 못할까?
스크림트래커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나도 너처럼 음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 말도 안 되는 논리가, 1993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작곡을 하게 된 트리거로 작용한 것입니다. 시작이야 말이 되던 안되던, 결국 약간의 질투심과 자존감이 엉뚱한 시도를 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 친구와의 만남이 저의 음악에 영향을 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음악적 성향도 달랐었고, 취향도 좀 달라서)
하지만 뭐랄까 좋은 라이벌 관계같은 레포를 형성시켜 주었기에, 제가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모로 많은 동기를 주었습니다.
소식이 끊어진지 정말 오래되었는데, 세삼 소식이 궁금하네요. 다음 시간에는 이 제야의 고수와의 전혀 음악적이지 않은 여러 애피소드를 옮겨 적어볼까 합니다.
'9oC의 전자음악 史 _ since 1992'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아웃사이더 음악. 241127 매물쇼의 유시민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21) | 2024.11.28 |
|---|---|
| 신해철을 그리며 (N.EX.T) (1) | 2024.11.24 |
| 9oC의 전자음악사_02. 변방의 북소리 (3) | 2024.11.23 |
| 9oC의 전자음악 역사 01. FM에서 MOD로 (0) | 2024.11.21 |